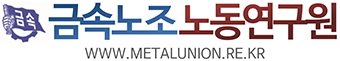6하원칙으로 재구성하는 정치적 개혁 담론
6하원칙을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아마도 조기 교육을 받는 유치원생들에게 물어보아도, 그것이 질문이냐고 하면서 깔깔댈 것이다. 그래도 나는 웃음거리가 되어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주권정부’가 내세우는 ‘개혁’을 6하원칙으로 재구성하기로 한다.
어떤 일이든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이유는 때때로 목적으로 옷을 바꿔 입는 경우가 많다. 123계엄내란사태를 촛불로 불태운 참여 국민의 힘과 국가권력의 개혁적 변화를 투표로 표시한 유권자의 지지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이기에, 개혁의 이유와 정당성은 촛불과 민주당을 지지한 유권자의 생각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자격을 내세워, 123계엄내란사태 당시의 상황을 소급하여 그 이유를 추론해 본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창피함을 느꼈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군대를 동원하다니. 권력균형의 한 축인 국회를 무력으로 침탈하다니.’ 당시에 국민 모두 느꼈을 감정이다. 그런데 나는 또 다른 감정이 올라왔었다. ‘국민을 뭘로 보는 거야?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권력이 나오는구나? 투표하고 난 이후에는 권리를 짓밟는 권력을 상대로 시위하거나, 시위하다가 구속되거나, 그저 권력의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가? 국민이 권력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시스템의 구축은 불가능한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정치적 개혁의 이유는 권력 속에서 참여 ‘국민’에게 권력을 관리하고 통제할 힘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누가 개혁을 주도할 것인가다. 국민주권정부의 수장은 틈나는 대로 ‘국민을 향하는 권력, 권력을 권력자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대리품, 제한적 개헌’ 등을 선언한다. 권력구조를 국민의 편에 서게 한다는 차원이다.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데 나는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을 말할 때 ‘참여 국민’과 ‘개혁적 유권자’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통합이라는 선언 문구를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국민’이라는 정체성의 혼돈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계엄내란정당으로 낙인된 국민의힘도 ‘국민’,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킨 더불어민주당도 ‘국민’, 국회나 국민주권정부를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 또 제도권의 제3당인 조국혁신당이나 진보정당들이 말하는 ‘국민’. 노동조합운동이나 시민운동을 주도하면서 ‘사회 개혁과 체제 전환’을 제기할 때도 ‘국민’이 등장한다. ‘국민’은 하나인데 쓰는 주체와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상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하지만 명백한 사실이 있다. 스스로 중산층으로 분류하는 사람도 많지만, 헌법 속 ‘국민’의 대다수가 노동자이자 농민이고, 도시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이다. 헌법은 개혁의 주체가 노동자와 민중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언제 어디에서 개혁을 주도할 것인가가 빠져 있다. 대통령이든 국회든, 개헌이나 국민을 향한 권력으로 구조를 개편하려 한다면, 그 개편의 주체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로 304명의 생명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때 알았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었다. 정치적 개혁도 골든타임이 있다. 참여 국민과 개혁적 유권자의 개혁 열기가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을 때다. 그 시작은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킨 원인을 해소하는 일이다. 권력이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것은 ‘권력 리그’의 함정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왔다. 방안이 멀리 있지 않다. 헌법 제1조 2항이 방안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규정 속 ‘국민’이 새로운 권력구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권력이 재편한 권력구조를 선거에서 투표만 하는 ‘국민’이 아니라,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의 실질적 주체를 ‘국민’으로 내세울 필요가 있다. 가칭 권한을 가지지만 권력에서 독립적인 ‘권력구조개편 시국회의’와 같은 참여 국민의 기구가 권력구조의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말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나, 대통령 후보자의 공약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선거 이외의 차원에서도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는 개혁의 이유와 맞물려 있다. 정치적 개혁의 과제가 두 가지의 전략적 방향으로 제기될 수 있다. 하나는 123계엄내란사태의 주동자들이나 방조자들을 권력의 자리에서 걷어내는 일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또 다른 하나는 헌법 속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를 실제로 보장할 권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기존의 권력 시스템은 이미 권력이나 권력자들을 보호하는 장치들이 구비되어 있다.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투(two) 트랙이다. 특검과 같이 현존 권력 시스템을 작동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는 123계엄내란사태의 진실을 바닥부터 하늘까지 파헤칠 권한이 부여되는 사회적 진실규명시스템이다. 진실은 바닷물 속에 가라앉아 있는데, 그저 빙산의 일각만 가지고 정치적이고 선정적인 놀이에 참여 국민을 몰아넣지 않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권리 시스템의 구축이다. 여기에서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다. 권리를 보장할 법의 제·개정만이 아니라, 법이 실제로 집행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권력이 권한을 헌법 속 국민에게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권력의 힘을 빼야 한다. 권력이 거의 독점해 왔던 인사권, 예산권, 감사권, 심판권 등을 국민이 나누어 가지는 차원의 개혁을 말하는 것이다. 나는 권력을 권한의 응집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정치사회가 ‘참여 국민’과 개혁적 ‘유권자’들을 권력의 도구로 삼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어떤 경우에는 권력이 주구를 앞세워 ‘국민’의 권리를 유린하기도 했다. 123계엄내란사태를 계기로 헌법 속 ‘국민’의 생각이 드러났다. 한국 사회는 권력으로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가 떠받히고 있다. 이에 상응하는 정치적 개혁의 출발은 ‘개혁과 국민’이 일체화될 때다. 정치사회는 헌법 속 국민의 부름이 있을 때나 호루라기를 불면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을 정치사회가 맡아서 해야 한다는 오만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개혁의 신호탄이 아닐까 생각한다.